한낮의 천문학
2018년 1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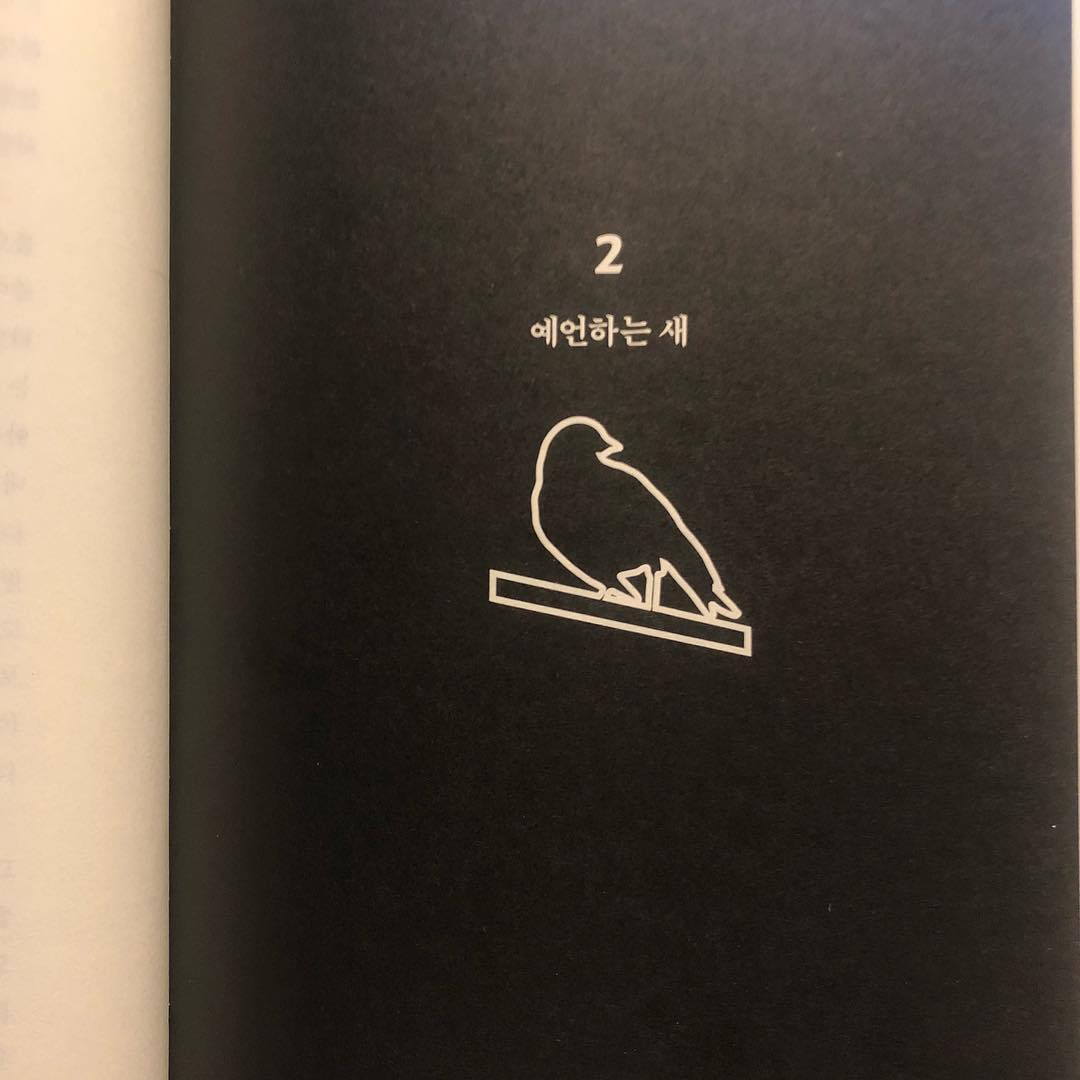
내가 하이볼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군만두와 맥주를 함께 먹는 것, 비행기가 떠오를 때 Le mal du pays를 듣는 버릇은 오로지 하루키 때문이다. 연말에는 하루키를 한번씩 읽는다. 하루키를 읽는 이유는 오직 ‘재미’때문인데, 어떤 소설이 순수한 차원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며 쉽게 읽힐 수 있을까 생각하면 별다른 대안이 없다. 나같은 사람을 무라카미 하루키즈라고 부르는 걸까 하며 ‘태엽감는 새’ 양장본을 주문했다. ‘태엽갑는 새’는 별 볼일 없는 남자주인공이 실종된 아내와 고양이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그린다. 그 여정 속에서 기이한 사람을 만나며 복잡한 역사의 그림자가 소환되고 그 역사는 주인공들의 삶을 변형시킨다. 이 줄거리에서 여느 클리셰처럼 선과 악의 대결, 고통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로 빠질 법도 하지만 하루키는 꾸준히 쉬운 구조를 벗어나 개인의 눈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는 법’에 대해 나아간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별거 아닌 부분은 쓱 건너뛰고, 조금이라도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 별거 아닌 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 수록, 나중 일이 잘 풀린다는걸 아니까 그러는 거야”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조금 비틀어 인생으로 가져와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어둠에 비유한다면, 어둠 속의 어둠을 보는 일이란 나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고통에 대한 은유일지 모른다. 자기기만과 자기합리화, 그 어떤 심리적 투사나 왜곡 없이 나를 오롯이 바라보는 일 말이다. 나는 나에게, 인간은 인간에게 자주 가혹하고 가끔 따뜻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어둠은 언제나 찾아오니까, 빛을 보는 것에 관성이 남아있어도 어둠에서 어둠을 보는 법을 꾸준히 배워야한다.
“시간이란 ABCD처럼 순서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쪽저쪽으로 오락가락하는 건가 봐요”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가 보는 일이라고 했을 때, 내년에는 순간 빛을 찾기 보다 어둠에서 어둠을 볼 수 있을까. 책에서 태엽감는 새가 주인공 그 자신이었듯, 내가 태엽 감는 새라면, 어둠에서 어둠을 보면서도 태엽을 성실히 감아 낼 수 있을까.
얼마 전 글을 쓰는 친구를 만났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는 일의 어려움을 여전히 해내고 있는 것 같아 퍽 고마웠다.